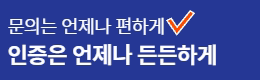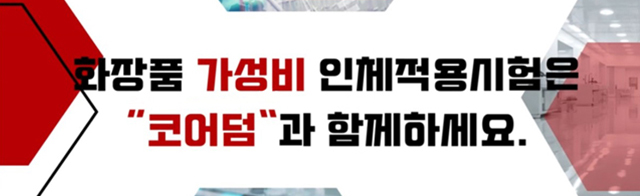탁구, 썸, 팟캐스트.
이 셋의 공통점은 뭘까. 쌍방향, Push and pull이다.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흐르고, 스밀 때 우리는 변한다. 마음이, 형질이 달라진다.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는 우연히 찾아온다. 예기치 않은 순간, 휘몰아치듯 퍼붓는 스콜처럼. 이때 몸을 통과하는 사람이나 장면, 메시지는 깊이 새겨진다. 드라마가 탄생한다. 이 드라마를 우리는 잊지 못한다. 바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클리세 없는 드라마는 예측 불가능성에서 완성된다. 배회하고, 발견하는 힘은 그래서 중요하다. 눈에 들어야 마음에도 든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빠진다.

최근 뷰티 소비자들에게 대대적인 구애를 펼친 기업이 있다. 화장품 사업에 공들이고 있는 무신사다.
이 회사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무신사 뷰티 페스타 인(IN) 성수’를 열었다. 대규모 뷰티 팝업 행사에 화장품 브랜드 40개가 참여했다.
무신사 뷰티 페스타는 숱한 화제를 낳았다. 특히 무신사와 올리브영의 대립구도가 부각됐다.
팝업의 성지 성수동을 놓고 벌이는 두 회사의 기싸움. 시작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역명병기다. 8월 12일 올리브영이 10억 원에 성수역 이름을 낙찰받았다. 올리브영의 1승. 2차전은 갑질 논란이다. "무신사 뷰티 페스타에 나가지 마“ 올리브영이 화장품 브랜드사를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K-뷰티 주도권을 놓고 두 회사가 정면충돌했다. 팝업의 성지인 성수동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는 반증이다. 이 싸움은 ‘성수대첩’ ‘뷰티대첩’으로 불리며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말 많게 시작한 무신사 뷰티 페스타. 첫날인 6일부터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비쳐졌다. 비 내리는 날씨, 도보 10분 거리에 분산된 4개의 행사장도 문제되지 않았다. 분홍색 무신사 쇼핑백을 들고 걸음을 재촉하는 이들 자체가 볼거리였다.
이런 진풍경에 행인도, 외국인 관광객들도 반응했다. 그러나 이들은 행사장 안으로 한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다. 무신사는 사전 초대하거나 티켓 구매자에 한해 방문을 허락했다. 일본 도쿄에서 온 일본인 모녀는 아쉬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번 무신사 뷰티 페스타가 의도한 것이 한정된 인원을 통한 바이럴 효과와 안정적인 티켓 수입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뷰티 잠재고객을 향한 장막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성수동을 자유롭게 오가는 이들, 한국을 경험하러 온 외국인들 앞에서 무신사는 문을 쾅 닫고 등을 돌렸다.
홍보는 참여와 관계구축이 핵심이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이끌고, 메시지를 심는 것이다. 필터링된, 알고리즘에 갇힌 정보를 하달하는 방식은 구태다.
힙스터들의 도시,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리는 성수에서 소통의 동맥경화 현장을 목격한 느낌이다. 메시지는 생물이다. 살아서 뛰는 맥이다. 흘러야 통하고, 통해야 닿을 수 있다.
무신사 뷰티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잃게 될) 것은 무엇일까. 핑크빛 쇼핑백과 화장품 샘플로만 소문난 그들만의 잔치는 아니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다. 열린 상태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밀도 높은 공감이 일어난다. 섞이고 맞물리고 중첩될 때 나오는 바이브가 있다.
물욕없는 시대, 소비자는 물건보다 기업(브랜드)이 발신하는 메시지에 주목한다. 뷰티 비즈니스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물건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과 이야기를 판다.
뉴요커‧내셔널지오그래픽 저널리스트 J. B. 매키넌은 저서 ‘디컨슈머’에서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온다”고 진단했다. 소비자가 바뀌면 소통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올리브영과 각을 세우고 있는 무신사는 제2의 유통공룡을 꿈꾸는 듯 보인다. 소비자에게 세심하게 주파수를 맞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신사 뷰티의 열린 소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