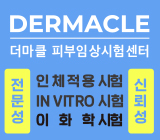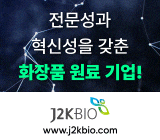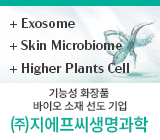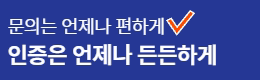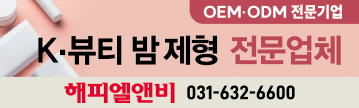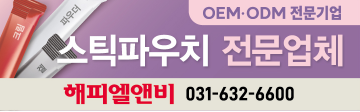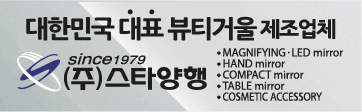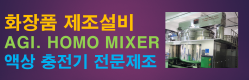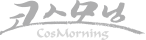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따라 K-뷰티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다. 미국 수출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가 경쟁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중국서 화장품을 제조해온 브랜드사는 생산기지를 다변화할 전망이다. 이는 화장품 OEM‧ODM 강국인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라는 관측이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부과, 화장품 산업 영향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를 오늘(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캐나다‧멕시코의 경우 한 달 유예하는 것으로 3일 결정했다.
현재 미국의 화장품 관세율(HS 코드 3304~)은 △ 캐나다‧멕시코‧한국 0% △ 중국 25% 등이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화장품 관세율은 △ 캐나다‧멕시코 25% △ 중국 35% △ 한국 0%가 되는 상황이다.

미국 화장품 수입국 순위를 보면 △ 캐나다 13%(3위) △ 중국 9%(5위) △ 멕시코 5%(6위)다.
트럼프 1기 관세 부과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캐나다‧중국‧멕시코 관세 부과는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닐슨에 따르면 미국 내 Beauty &Personal Care 매스(Mass) 제품 중 미국 생산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미국 수출국 중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이 중국산 화장품에 부과한 관세는 ‘기본 관세+ 301조 추가 관세’로 구성됐다.
미국은 WTO/FTA 회원국에 대해 화장품 무관세를 적용했다. WTO 회원국인 중국도 무관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화장품 품목이 301조 추가 관세 List 3에 포함되면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2018. 9. 24 발효), 이후 추가 관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했다(2019. 5. 10 발효).
관세 부과는 화장품 완제품뿐 아니라 포장재‧원재료 등 화장품 원부자재까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산 화장품 수입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전년 대비 6%, 25% 감소했다. 미국의 화장품 수입에서 중국 비중도 △ 2017년 21% △ 2019년 14% △ 2024년 9%로 줄었다.
반면 가격 경쟁력과 효능을 내세운 K뷰티는 C뷰티의 대체재로 떠올랐다. 미국의 화장품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9%에서 2024년 22%로 확대됐다.
권우정 연구원은 한국콜마의 미국 제2공장 가동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콜마는 올해 상반기 내 미국 제2공장(기초‧선 제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국내 공장이나 미국 1공장 대비 자동화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자동화 설비를 바탕으로 기초화장품과 선케어 제품을 집중 생산할 계획이다.
권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와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했다. 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K뷰티의 주가 낙폭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부담을 피해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국을 변경하는 브랜드가 많아질 움직임이다. 한국콜마를 통해 미국생산을 타진하는 브랜드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